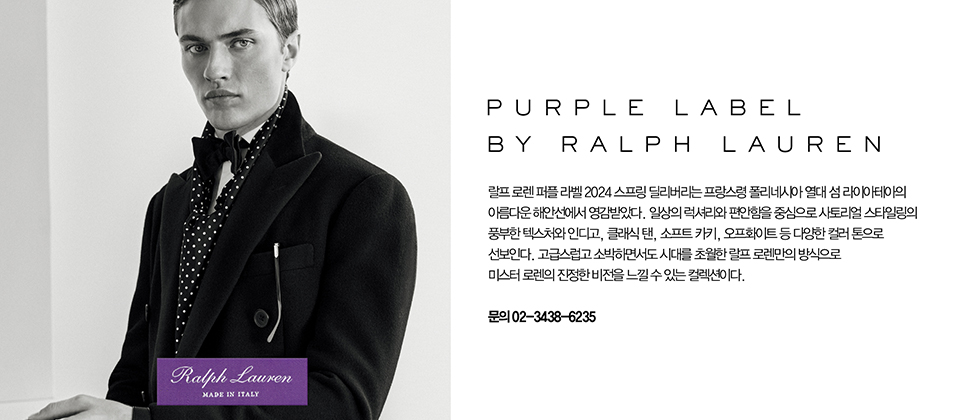얼마 전 키아프와 프리즈 아트 페어의 동시 개막과 더불어 펼쳐진 아트 주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국내 최초 공개한 백남준의 대형 레이저 설치 작품 ‘트랜스미션 타워’도 마찬가지다. 백남준의 ‘트랜스미션 타워’는 뉴욕 9·11 테러가 일어난 이듬해인 2002년 뉴욕 록펠러 센터 앞에서 세계에 평화와 위로를 전달했던 작품이다. 당시 아카이브 영상을 보면, 뉴욕 록펠러 센터 앞 반짝이는 타워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은 백남준이 휠체어에 앉아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두드리는 광경을 보게 된다. 은색으로 칠한 오래된 자동차들(‘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 사이로 거대한 타워가 서 있고, 담백하게 울리는 피아노 소리에 따라 타워 위 레이저 선들이 하늘을 수놓는다. 백남준의 레이저 협업자 노먼 발라드가 백남준의 피아노 사운드에 맞추어 네온과 레이저가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해 노년의 거장을 도왔다. 백남준은 당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레이저 광선은 대단히 신비스럽고, 달콤하고, 숭고하기까지 하단 말이야”라고. 당시 투병 중이었던 백남준에게 레이저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였다.
20년 만에 국내에 첫 공개된 ‘트랜스미션 타워’는 클래식 자동차 5대, 모차르트의 진혼곡과 함께 백남준아트센터 뒤뜰에서 선보였다(12월 3일까지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특별전 <트랜스미션: 너에게 닿기를> 전시의 일환). 레이저와 네온이 만들어내는 빛도 신비롭지만, 백남준을 오마주한 윤제호 작가의 레이저와 사운드 디자인이 더해지며 현대성이 증폭되었다. 먼 우주에서 오는 주파수 같은 사운드와 함께 타워의 레이저가 숲과 언덕에 쏟아질 때 오로라가 펼쳐지는 북유럽 어딘가에 와 있는 듯하기도 하고, 막막한 우주에서 행성을 보는 것도 같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백남준의 끝은 어디까지일까’라는. 그리고 우리는 백남준이 레이저 빛으로 상상했던 정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의 예견처럼 인간과 기술이 균형을 이루는 환경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백남준이 인간과 기술,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등 장르 간 경계를 뛰어넘고 혁신과 통합을 실천한 세기의 낙관적인 예술가라는 점은 현재 시점에서 두손 갤러리의 전시 <I never read 1984>(10월 28일까지)에서 느낄 수 있다. 전시 제목은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적 소설 <1984>를 이용한 것이다. 사실 소설에서 1984년 미래는 테크놀로지 기계에 감시당하는 통제된 디스토피아적 삶으로 묘사되지만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인공위성을 활용해 텔레비전 쇼인 ‘굿모닝 미스터 오웰’을 선보이며, 기계문명에 대한 절망과 비관이 아니라 테크놀로지를 통해 전 세계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유토피아적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전시인데, 그중 ‘Video Chandelier’ 작품이 새롭게 다가온다. 인간과 자연, 기계의 공생을 꿈꾼 백남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식물과 TV를 결합하고 샹들리에를 더한 무척 아름다운 작품이다.
“한편에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고, 다른 한편에 소통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가끔 그 둘이 그리는 곡선이 교차한다(그러나 소통과 전혀 연관이 없는 예술 작품도 수없이 많고, 예술적인 면이 전혀 없는 소통도 많다). 그 지점에 사과 씨앗 같은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다. 어쩌면 우리의 꿈일지도 모른다.” 1980년 3월 뉴욕 현대미술관의 학예사 바버라 런던이 기획한 <비디오 관점들> 시리즈의 하나로 백남준은 ‘임의 접속 정보’라는 강연을 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소통은 인간과 자연, 자연과 기술, 인간과 기술의 소통이었다. 하지만 꿈일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평생 음악, TV, 비디오를 통해 소통, 공유, 분배를 꿈꿔왔던 그는 노년에도 여전히 새로운 매체인 레이저를 탐구하며 사유를 멈추지 않았다. 그의 꿈이 담긴 작품이 공개될 때마다, 적어도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빛이 존재한다는 걸 일깨워주는 백남준은 어쩌면 지금도 먼 우주 어딘가에서 쇼팽의 에튀드를 연주하면서 ‘빛’을 보내고 있을 것만 같다.
2 백남준, ‘20세기를 위한 32대의 자동차: 모차르트의 진혼곡을 조용히 연주하라’(1997). 리움미술관 소장. 이미지 제공_백남준아트센터
3 백남준아트센터 전시실 내부로 이어지는 백남준의 아카이브 영상에서 2002년 뉴욕 록펠러 센터 앞 광장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다. 백남준의 피아노 퍼포먼스 ‘20/21’도 감상할 수 있다.
4 ‘삼원소: 삼각형’(1999). 백남준이 레이저 전문가 노먼 발라드와 함께 제작한 작품으로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열린 회고전 <백남준의 세계>에서 처음 전시되었다. 이미지 제공_백남준아트센터
5~6 두손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백남준의 전시 <I never read 1984> 풍경. 자연, 인간, 기술이 모두 녹아 있는 이번 전시는 포스터부터 판화, 드로잉, 사진 작품까지 볼 수 있다. 기술과 자연이 서로 순환을 이루는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